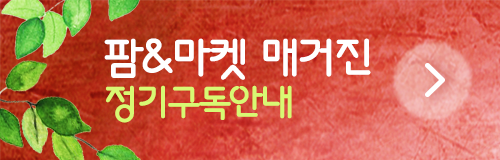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농기계는 필수다. 파종부터 모내기, 제초, 수확, 건조까지 모든 과정에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농가는 막대한 수리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농기계는 필수다. 파종부터 모내기, 제초, 수확, 건조까지 모든 과정에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농가는 막대한 수리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한 수도작 농가는 트랙터 고장으로 5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지출했다며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농가 소득이 크지 않은 현실에서 농기계 고장이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다.
농기계 수리비 부담은 구조적 문제다.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 가격이 비싸고, 정비 인력이 부족해 인건비도 상승한다. 농번기에는 시기를 놓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농기계 수리비 지원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첫째, 농기계 수리비 직접 지원 확대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수리비 지원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작 농가처럼 기계 의존도가 큰 농업 분야에는 우선적으로 절실할 듯하다.
둘째, 농기계 보험 개선이다. 현재 농기계 종합보험은 사고 중심 보장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장·수리비까지 보장하는 현실적인 보험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공공 농기계 센터 정비 기능 강화이다. 예방 정비를 통해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넷째, 소규모·고령 농가 맞춤형 지원이다. 수리비 부담은 영세 농가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해 고령농가와 소규모 농가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쌀은 우리 식탁의 근간이다. 쌀 산업의 지속성은 필수이지만 매년 농가는 쌀 가격뿐 아니라 농기계 수리비 등으로도 농업인의 땀이 허무하게 사라진다면 수도작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비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농업인의 땀방울이 농기계 수리비 앞에서 또 한번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 맞춤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발행인 | 문학박사 최서임
* 이 기사는 팜앤마켓매거진 2025년 9월호에 게재됐습니다.